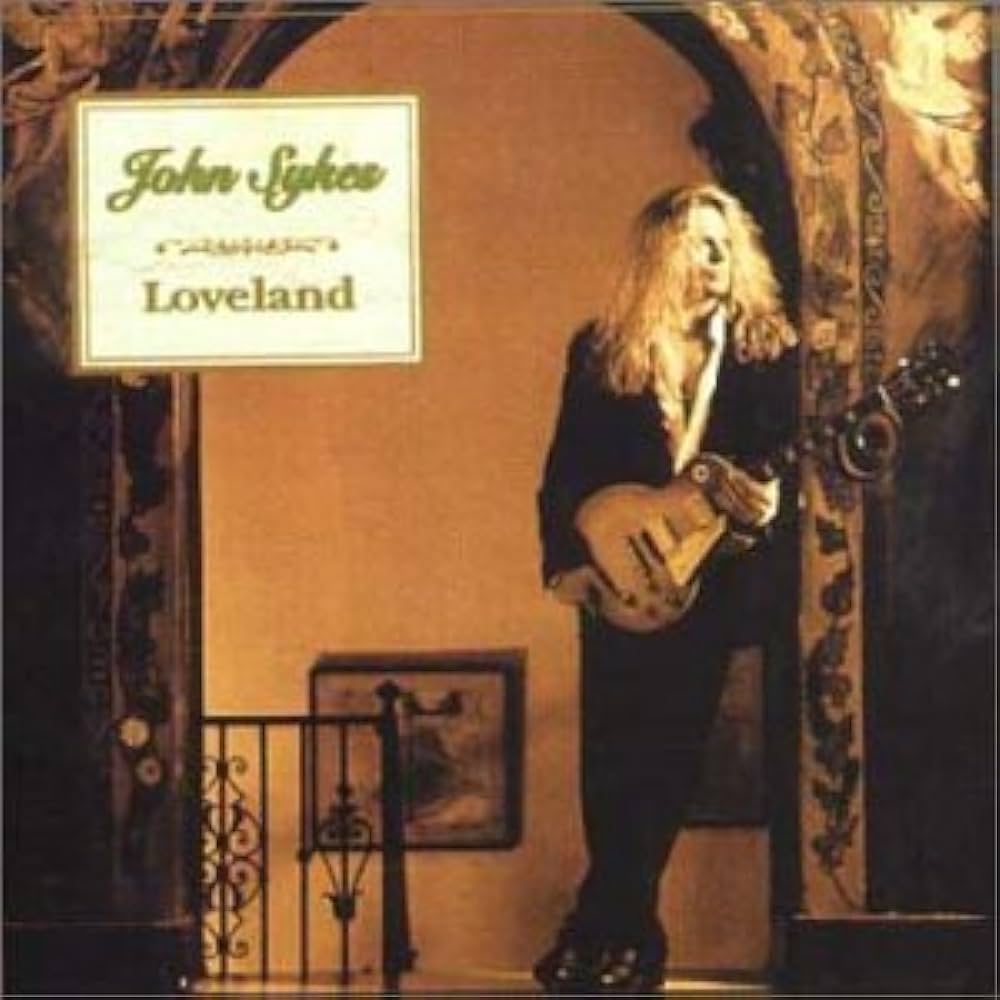Kirlian Camera만큼 커리어 내내 탐미적인 스타일을 유지해 온 일렉트로닉 밴드는 매우 드물 것이라 생각한다. 말이 드물다지 이 밴드가 1979년부터 시작된 장르의 개척자 중 하나임을 생각하면 이만큼 일관된 커리어는 사실 유일하다고 해도 괜찮겠거니 싶다. 덕분에 Kirlian Camera에 대한 씬에서의 존중은 생각보다 더 높은 것처럼 보인다. Abbath와 The True Endless 등에서 베이스를 잡았던 Mia Wallace가 이 ‘팝’ 밴드에 세션으로 합류한 건 그런 의미에서 보여주는 바가 있을 것이다. 하긴 이 분이 합류한 것도 2018년이니 이젠 그리 신기할 얘기도 아니다.
3년만의 신작은 더블 앨범으로 나왔는데, 밴드가 늘 그랬듯 탐미적인 류의 다크-팝 스타일이지만 그 범위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은 꽤 다채롭다. 앨범마다 꼭 하나 이상은 등장하던 사이키한 앰비언트풍의 ‘Genocide Litanies’나, 몽환적이지만 무척이나 팝적인 ‘The Great Unknown’, 밴드의 어두운 측면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Il Tempo Profondo’, 네오클래시컬 튠이 돋보이는(덕분에 잠깐 Ataraxia 생각도 나는) ‘Madre Nera’ 등은 사실 밴드의 다른 앨범에 수록되었다고 하더라도 위화감이 없을 정도의 곡들이지만, 이 앨범에서 서로 잘 어울려 나름의 분위기를 이뤄낸다. Elena Fossi의 적당히 관능적인 보컬이 더해지면 이제 음악은 고쓰의 경계까지 넘본다. 사실 이런 건 모두 40년 넘게 밴드가 보여준 모습이기는 하지만 Depeche Mode의 ‘Wrong’ 커버에 이르면 이 스타일이 아직도 충분히 세련되게 들린다는 점도 더욱 명확해진다.
700장 한정 아트북에는 보너스 한 장이 더 들어가 있다는데 한 장 또 사야 하나…
[Dependent, 2024]